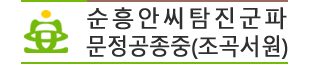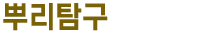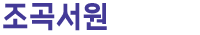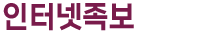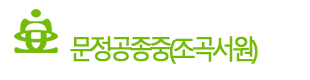◈ 예조 판서 합하께 올린 글(上書于大宗伯閤下)
경상도 대구(大邱) 유생 서인복(徐麟復)ㆍ최택(崔澤), 안동(安東) 유생 김정술(金鼎述) 등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백번 절하며 예조 판서 합하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충절을 표창하고 어진 이를 본받게 하는 것은 조정의 성대한 의식이고,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은 사문(斯文)의 성대한 의식입니다. 우리 추충절의 정난공신(推忠節義靖亂功臣)평장사(平章事) 오성군(鰲城君) 안 선생(安先生) 휘(諱) 우(祐)와 그의 현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문정공(文靖公) 고은(皐隱) 안 선생 휘 지(止)에 이르기까지 그 순수한 충의와 거룩한 공적, 문장과 도학은 실로 미숙한 후생이 엿보아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참으로 사책(史冊)에 찬란하게 빛나고 이목(耳目)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실만으로 그 대략을 거론하며 합하를 위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오성군은 공민왕 조정을 맞아 추악한 조일신(趙日新)의 무리를 처형하고, 홍건적의 난에 이르러서는 하루아침에 신속히 도적들을 소탕하여 삼한(三韓)을 다시 세웠으나, 승리를 보고하는 날이 되자, 마침내 간신 김용(金鏞)의 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은(圃隱 : 정몽주) 정 선생(鄭先生)이 그의 충절과 의리를 애석하게 여겨 글을 지어 제사를 지냈고, 명나라 이서애(李西崖 : 이몽양)는 그의 장렬한 공훈을 서술하며 시로써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고려사(高麗史)》본전(本傳) 및 제강(提綱)과 찬요(纂要) 등의 서책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태조대왕에 이르러서는 임금께서 특명으로 복지겸(卜智謙)ㆍ신숭겸(申崇謙) 등 여러 명공과 함께 숭의전(崇義殿)6)에 배향하여 한자리에 서 함께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으며, 본조(本朝) 문양공(文襄公) 양성지(梁誠之)가 조정에 주청하여 문선왕묘(文宣王廟 : 공자의 사당) 제례에 의거하여 무성왕묘(武成王廟 : 태공망 사당)를 건립할 때 공도 함께 봉안하도록 하였으니, 어찌 옳은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문정공 고은 선생은 세종조를 맞아 뛰어나게 훌륭한 자질 및 효성과 우애에 바탕을 둔 성실함으로 일찍이 매헌(梅軒 : 권우) 권 선생(權先生)의 문하에 종유하였고, 포은과 목은(牧隱 : 이색)의 연원을 이어받았으며, 다섯 조정을 섬기고도 다시 문형(文衡 : 대제학)의 직임을 맡아 변춘정(卞春亭 : 변계량)ㆍ서사가(徐四佳 : 서거정)ㆍ김점필(金佔畢 : 김종직) 등 여러 어진 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번갈아 가며 이끌어 국가의 흥성을 울려 퍼지게 하였고, 임금이 조종(祖宗 : 임금의 조상)의 쌓은 왕업을 기술하라는 명령을 내려〈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었을 때, 특별히 칭찬을 받고 노래의 제목을 짓자, 참찬 정인지(鄭鱗趾)가 서문을 쓰고, 취금헌(翠琴軒 : 박팽년) 박 선생(朴先生)과 매죽헌(梅竹軒 : 성삼문) 성 선생(成先生)이 주석을 달고 풀이를 하였는데, 태허정(太虛亭 : 최항) 최 상공(崔相公)은 발문을 써서,
“실로 상(商) 나라의 현조(玄鳥)와 주(周) 나라의 천작(天作)의 시와 더불어 길이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진풍연(進豊宴 : 대궐의 잔치)에서 임금이 공과 마주하여 춤을 추면서 그 정경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명령하고 마침내 어의(御衣)를 하사하셨는데, 공이 연구(聯句)를 지어 올리기를,
“살아서 성군을 만나니 오히려 늦음이 원망스럽네.” ▷ 生逢聖主猶嫌晚
라고 하니, 임금이 짓기를,
“옛 친구와 서로 즐김에 아직도 초반이 지나지 않았도다.” ▷ 故友相權未始伴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세조실록(世祖朝實)》과《열성어제(列聖御製)》에 명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문강공(文康公) 저헌(樗軒 : 이석형) 이 선생(李先生)은 시를 지어,
재주도 없이 외람되이 문하생이 되니 ▷ 不才濫叨門桃李
잘못 알아주심에 부끄러워 얼굴 먼저 붉어졌네 ▷ 多慙謬知面先紅
사람은 세 가지7)에 있어서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나니 ▷ 人生於三事如一
존명을 듣고 어찌 따르지 않으리오 ▷ 我聞尊命寧無從
라고 하였습니다. 아! 두 선생의 우뚝한 공훈의 실제 기록은 모두 성담(性潭 : 송환기) 송 선생(宋先生)이 지은 전(傳)8)에 실려 있으니, 무릇 우리 동녘 땅의 인사(人士)라면 누군들 흠모하여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본도 자인현(慈仁縣)의 조곡서원(早谷書院)은 두 선생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장소이나 봄과 가을의 향례를 올릴 때 현에서 단지 향과 축문만 보내주고 희생(犧牲)과 폐백(幣帛)은 마련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사림이 개탄하고 사문의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본도의 전임 순상(巡相 : 관찰사) 이 상공(李相公) 합하께 함께 호소하였더니, 그의 제사(題辭 : 관아의 판결문)에,
“안씨의 사적은 사람의 이목에 밝게 드러나니, 누군들 흠모하지 않겠는가. 봄과 가을의 향사 때 단지 향과 축문만 싸서 보내는 것은 흠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현이 잘 처리하여 향사에 예의가 갖추어지도록 하라.”
고 지시하였으나, 마침 벼슬이 갈리는 때를 맞아 본현이 머뭇거리며 일을 얼른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지금의 순상 정공(鄭公) 합하께 함께 호소하였더니, 그의 제사에,
“전임 순상의 제사가 이와 같고 사림의 논의가 이와 같으며, 선현을 숭상하고 흠모하는 의식에 관한 일에 어찌 다른 논의가 있겠는가. 본읍에서 좋은 쪽을 따라 상의하고 확정하여 여러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게 하라.”
라고 지시하였으나, 본현은 본조(本曺 : 예조)에서 제사를 매긴 관문(關文 : 하급관청에 보내는 공문)이 없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선뜻 허락을 하지 않으니, 사림의 서운함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합하께서는 사림에 명망이 높으시고 국가의 의례를 담당하시니, 어진 이를 숭상하고 표창하는 의리에 있어서도 마땅히 빠진 전례를 갖추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풍문만 듣고도 일어나 천리 길에 발을 싸매고 와서 외람됨을 무릅쓰며 이에 감히 호소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합하께서 특별히 선현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뜻을 붙이시어 즉시 본현의 상서(上書)에 관문을 내려서 지금 이후로 봄과 가을의 향사 때 희생과 폐백을 마련하여 제사 의례에 흠결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사문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간절히 기원하는 심정을 가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서기 1828년(무자) 10월 일
창녕(昌寧) 유생 : 장남□(張南□)ㆍ김낙□(金洛□)ㆍ성경록(成慶綠).
경산(慶山) 유생 : 서유간(徐維幹)ㆍ한명량(韓命良).
청도(淸道) 유생 : 이행선(李行善)ㆍ박존효(朴尊孝)ㆍ김재명(金再鳴)ㆍ이규복 (李奎復).
밀양(密陽) 유생 : 손종박(孫鍾璞)ㆍ박치호(朴致浩).
현풍(玄風) 유생 : 곽흥익(郭興益)ㆍ이복강(李復綱).
의성(義城) 유생 : 이종발(李鍾發)ㆍ신면호(申冕浩).
영천(永川) 유생 : 정관신(鄭觀新).
경주(慶州) 유생 : 한상정(韓相鼎)ㆍ이만근(李萬根)ㆍ서재순(徐在舜).
대구(大邱) 유생 : 서재영(徐在永)ㆍ안종해 (安宗海).
의령(宜寧) 유생 : 이치규(李穉奎)ㆍ김치수(金致洙).
선산(善山) 유생 : 심재구(沈齋龜)ㆍ황열원(黃烈源).
하양(河陽) 유생 : 조학봉(曺學鳳)ㆍ홍재효(洪載孝).
의흥(義興) 유생 : 흥병덕(洪秉德)ㆍ김상락(金相洛) 등.
예조 수결
제사(題辭) : 이미 영읍(營邑)의 제사가 있으니, 본관에게 부친다.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여 사전(祀典)에 흠결이 없도록 할 일이다.
16일 본관
上書于大宗伯閤下
慶尙道大邱儒生徐麟復崔澤, 安東儒生金鼎述等, 謹齋沐百拜, 上書于大宗伯閤下. 伏以褒忠象賢, 朝家之盛典, 立祠崇報, 斯文之縟儀. 惟我推忠節義靖亂功臣平章事, 鰲城君安先生諱祐, 暨于玄孫, 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諡文靖公, 皐隱安先生諱止, 其精忠壯烈, 文章道學, 實非後生末學之所可窺測, 而誠以其炳朗竹帛, 輝耀耳目者, 略擧其槩, 而爲閤下陳之. 鰲城君當恭愍朝, 誅趙日新之醜黨, 逮夫紅巾之亂, ᅳ朝迅掃, 再造三韓, 及其獻捷之日, 乃爲奸臣金鏞之所害. 圃隱鄭先生惜其忠義, 爲文以祭, 皇明李西崖述其勳烈, 詩以爲歌. 此皆昭著麗史本傳及提綱纂要等書, 而迄我太祖朝, 特命配食於崇義殿, 與卜ㆍ申諸名公, 一體同祀, 本朝梁文襄公誠之奏請于朝, 依文宣王廟祭禮, 立武成王廟, 而公亦與焉. 豈不韙歟! 且文靖公皐隱先生, 當世宗朝, 以奇偉之姿, 孝友之誠, 早遊於梅軒權先生之門, 承襲乎圃牧淵源, 歷事五朝, 再掌文衡, 與卞春亭徐四佳金佔畢諸賢, 倂武迭倡以鳴國家之盛, 而自上命述祖宗積累之業, 作龍飛御天之歌, 特蒙嘉賞, 而命名之, 參贊鄭鱗趾序之, 翠琴朴先生梅竹成先生註解之, 太虛崔相公跋之曰:“實與商之玄鳥, 周之天作之詩, 幷傳而不泯者也.”又於進豊之宴, 上與之對舞, 而命畵圖, 仍賜御衣, 公製進聯句曰:“生逢聖主猶嫌晩.” 御製曰:“故友相權未始伴.” 此皆昭載於世祖朝實錄及列聖御製. 文康公樗軒李先生撰詩曰:“不才濫叨門桃李, 多慙謬知面先紅. 人生於三事如一, 我聞尊命寧無從.”噫! 兩先生嵬勳實錄, 俱載於性潭宋先生所作傳文中, 則凡我東土人士, 孰不艷慕而咨嗟哉! 本道慈仁縣, 早谷書院, 卽兩先生妥靈之所, 而春秋享禮時, 自縣只封香祝, 而牲幣未備. 玆豈非士林之所慨惜, 而斯文之欠典耶? 爲此而聯籲於本道前巡相李公閤下, 則題曰:“安氏事蹟, 炳人耳目, 孰不欽慕! 春秋享禮時, 只以香祝䝴送者, 可謂欠典. 自本縣善處, 使享祀備禮.”爲敎, 而適値遞等, 則本縣因循持難, 故更爲聯籲於今巡相鄭公閤下, 則題曰:“前使之題如此, 士林之論如此, 凡係崇慕之典, 豈有他議! 自本邑, 從長講礭, 以副多士之望.”爲敎, 而本縣謂無本曺題關, 尙此靳許, 其在士林之缺望, 當如何哉! 伏惟閤下, 望著士林, 職典邦禮, 至於崇獎之義, 宜備闕典. 生等聞風而起, 千里裹足, 不避猥越, 玆敢仰籲. 伏願閤下特寓尊慕之義, 卽爲背關於本縣, 自今以往, 春秋享祀時, 使備牲幣, 得以祀禮無闕, 則斯文幸甚. 無任祈懇屏營之至.
戊子 十月 日.
禮曺 手決
昌寧儒生 : 張南口ㆍ金洛口ㆍ成慶綠.
慶山儒生 : 徐維幹ㆍ韓命良.
淸道儒生 : 李行善ㆍ朴尊孝ㆍ金再鳴ㆍ李奎復.
密陽儒生 : 孫鍾璞ㆍ朴致浩.
玄風儒生 : 郭興益ㆍ李復綱.
義城儒生 : 李鍾發ㆍ申冕浩.
永川儒生 : 鄭觀新.
慶州儒生 : 韓相鼎ㆍ李萬根ㆍ徐在舜.
大邱儒生 : 徐在永ㆍ安宗海.
宜寧儒生 : 李穉奎ㆍ金致洙.
善山儒生 : 沈齋龜ㆍ黃烈源.
河陽儒生 : 曺學鳳ㆍ洪載孝.
義興儒生 : 洪秉德ㆍ金相洛, 等.
旣有營邑之題, 付之本官. 從長善處, 俾免祀典之欠闕, 爲宜事. 十六 本官.
<註>
6)승의전(崇義殿)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있는 고려 태조와 일곱 왕을 제사지냈 던 사당이다. 1397년에 조선 태조의 명으로 묘(廟)를 세워 1399년에 고려 태조 와 일곱 왕을 제사지냈다. 문종은 이곳을 ‘숭의전’이라 이름을 짓고,고려조의 충 신 정몽주 외 열다섯 사람을 제사지내도록 하였으며, 고려 왕족의 후손들로 하여 금 이곳을 관리하게 하였다.
7) 세 가지 :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한다.
8) 전(傳) :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1728〜 1807)의 문집《성담집(性潭集)》권30 에〈오성군안공정(鱉城君安公傳)〉이 실려 있다.